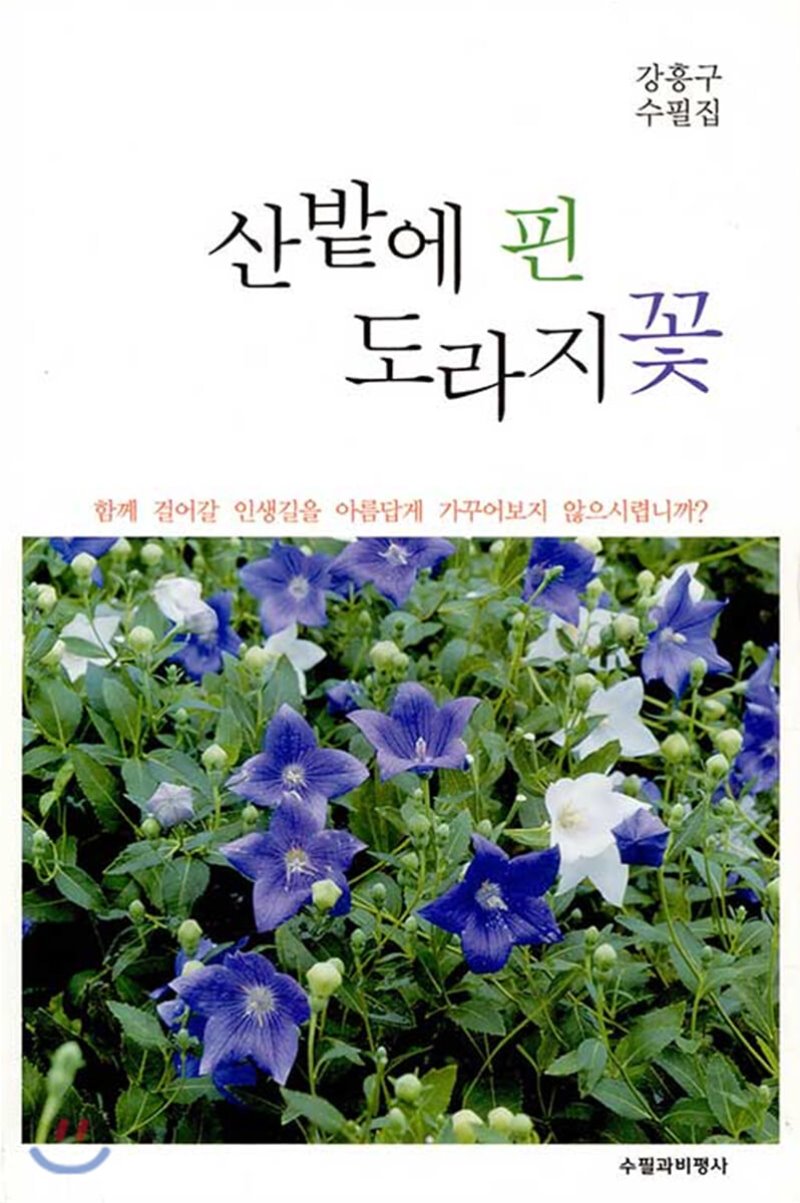생태문명과 원형原型문학 - 『한국수필』 3월호를 읽고- 이방주 21세기를 지배하는 화두는 생태문명이어야 한다. 우리 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산업과 물질문명에 기대어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인류가 잊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풍요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고 헤치고 할퀴면서 누리는 폭력적 문명이었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인류의 삶에 큰 재앙이 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면 14세기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이나 감소시켰던 페스트의 대유행을 들 수 있다. 이후 유럽 인구를 13세기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 가능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페스트로 사망했는지 알만하다. 20세기 들어 지구온난화로 페스트에 못지않은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일..